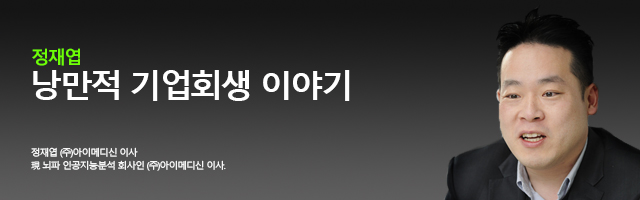그 시기가 조명 속의 무대처럼 환하게 떠오른다. 그때를 떠올리면 내 머릿속은 온통 추적추적 내리던 한여름의 장맛비로 젖어든다. 기억마저 젖은 양말마냥 조금씩 침식되어가는 듯하다. 우산을 써도 몸을 향해 쏟아지던 빗방울들. 하지만 그 덥고 습하던 그림의 한쪽에는 빨간 우산을 쓴 채 노란 장화를 쓴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간다. 혼란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픔이었다. 또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인생에 완성이라는 것은 있기라도 한 것인가. ‘아, 그 때......’ 하고 가볍게 일축해 버릴 수 없는 과거의 시기가 있다. 짧은 시기지만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기. 세월의 힘은 강한 것인가. 많은 시간 그 장맛비 내리는 그림 위에도 무지개가 뜨고 안개가 걷히면서 서서히 둔갑한 상처처럼 더께가 내려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덧 그 장맛비가 더 이상 우산을 뚫고 내 관자놀이를 관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시기에 내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우산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산을 빌려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다. 그저, ‘괜찮니?’라는 말 한마디였다. 이 칼럼은 현재 우산 없이 쏟아지는 비바람을 맞고 계시는 분들에게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마음으로 쓴다.
2013년 7월 23일.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4억 8천만 원이 도래하는 날이다. 오후 6시까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최종 부도를 맞는다. 은행 지점장은 아침부터 5분 간격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다.
“아직도 자금 마련하지 못하셨어요?”
“네. 지점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전화 드릴께요.”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이제 핸드폰 배터리는 10%가 남지 않은 상황이다. 나는 서둘러 문자를 보낸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독점으로 판매하던 총판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의약품을 생산하던 회사는 약 2년 전부터 전문 의약품의 보험수가가 53.55%로 하향 조정 되었다. 이는 기반이 취약한 중소제약회사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총판은 오히려 담보를 설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회사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날 도래한 어음과 당좌수표 전액이 특정회사의 것이었다는 것은, 회사를 의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다.
당일 아침부터 새로운 총판업체를 찾아갔다. 부도가 날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긴급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회사의 대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은행 마감시간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 대표는 어디에선가 누군가와 상의하는 소리만 들리고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다.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 시간이 지속되었다. 은행 지점장에게서는 문자가 왔다.
‘아직 자금 마련이 안되셨어요?’
그 대표는 철썩 같이 약속을 하였기에, 믿고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그가 회의실에 있으면서 가끔씩 나와서 얼굴을 내비칠 때마다 그는 은행 마감 시간 내에 틀림없이 회사에 5억 원을 입금하겠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핸드폰의 배터리는 7%를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그 대표는 다시 다른 제안을 했다. 그동안 우리가 생산해 온 제품에 대한 허가권 및 상표권 원본을 첨부해서 이 제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 회사는 최종부도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일단 제품의 허가권 및 상표권의 원본을 주지 않으면 긴급자금을 마련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회사는 마지막까지 긴급자금을 줄 것을 믿고 서명을 하고 공증까지 해 주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은행 업무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았다. 나는 입이 바싹 마르고 다리가 부을 정도로 서 있었다. 그 대표는 회사 통장을 보여주며 얄밉게 이야기 했다.
“자- 사장님. 보세요. 입금 시킬 돈이 없네요.”
결국, 한 해 매출 150억에, 30년간 의약품 생산을 하던, 한 작은 중소기업은, 생명을 다했다. 약 80여명의 직원들은 신성한 일터를 잃었다. 매출의 약 50%에 해당되는 제품 허가권은 바로 눈 앞에서 빼앗겼다. 어음 4억 8천만 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를 맞은 것이다. 내 손 안에 있던 핸드폰의 배터리는 방전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책에 꽂혀있는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의 책 <변신>을 읽었다. 읽었다기 보다는 그냥 눈으로 훑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는 주인공처럼 나 자신이 벌레가 되고 싶었다. 카프카 자신도 평생을 벌레처럼 지냈다. 독일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시온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든 이에게 배척받았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작품을 벌레라고 생각해 세상에 내놓기를 꺼렸으며, 발표된 작품들도 대중의 몰이해 속에 거의 팔리지도 않았다. 불확실성과 불안한 내면을 독창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그의 사망 후에야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는 <변신>에서 ‘벌레’를 통해 ‘기능’으로만 평가되어 인간이 존재의 의의를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인의 삶,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삶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불안한 의식과 구원에의 꿈 등을 <변신>에서 카프카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로, 기이하고도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다.
2013년 7월 23일. 벌레가 되고 싶었으나, 벌레가 되지 될 수 없었던 나는, 3년간 벌레인간으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의 두 팔은 다리가 되었고,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점액질이 분비되었으며, 나의 두 팔에서는 검은 털이 돋아났으며,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며 혐오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빛을 싫어했고, 밤을 사랑했으며, 몸에서는 악취가 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