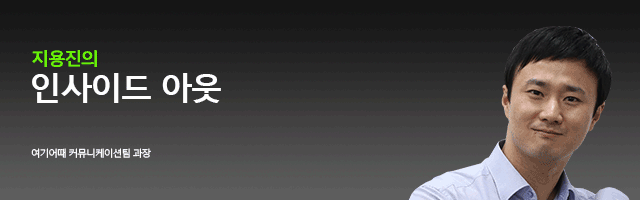의무근무시간 이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다. 일례로 프랑스는 ‘비접속 권리법(연결차단권)’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접속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업무 외 이메일, SNS, 전화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한 것. 법으로 정한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 관련 지시 및 회의를 방지하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했다. 근무 시간 외에 회사 일로 연락하는 것이 개인의 삶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삶의 질’이 뛰어나다는 프랑스조차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는 걸 보면 근무 시간과 행복 지수의 함수 관계는 적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이 현실에 안착하는 경우는 희박하다.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어때의 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어때는 오는 4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월요병’ 해소를 위해 월요일 오후(13시) 출근을 제도화해 4.5일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이른바 ‘나인 투 식스’(9~18시)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시간보다 효율에 방점을 둔 근무 환경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제도의 바탕이다.
사실 근무 시간으로 직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봉건 시대의 잔재다. 이제는 그런 전근대적 풍토에서 과감히 벗어날 때다. 그래야 삶의 질이 개선된다. 업무시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기업의 경쟁력을 키운 사례는 수두룩하다. 여기어때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을 고민했다. 임직원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를 제공하고, 헬스 비용을 지원한다. 또 숙박 서비스 기업에 걸맞게 매년 여기어때 포인트(매년 50만원 상당)를 지급해 여행을 독려한다.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이 앞장서 이런 구체적인 제도를 표방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시 퇴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주요 화두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2위다. 야근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같은 문구는 한국 사회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에 찌들어 사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그럴듯해 보인다. 정부가 앞장서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다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 일단 우리보다 앞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한 일본의 반응을 보자. 일본은 지난 2월 24일부터 금요일 조기 퇴근을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첫 시행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후 3시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만큼 정부의 노력이 각고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본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도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행 첫날 일찍 퇴근한 사람은 3.7%에 불과했다. 1980년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본 열도에 열풍을 일으켰던 ‘하나킨(花金, 꽃의 금요일)은 추억으로 봉인될 것 같은 초라한 반응이다.
2004년 김대중 정부 들어 주 40시간 노동을 근로기준법으로 첫 시행한 이후, 우리 정부는 노동 강도를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오롯이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아직 주 5일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씁쓸한 통계도 있다.
여기어때 같은 스타트업은 기업의 특성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정부가 내건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기업 특성에 맞게 설계된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시너지가 기대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어때가 지향하는 가치인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만드는 좋은 서비스’다. 여기어때의 유연근무제는 막 도입했기에 당장의 효과는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