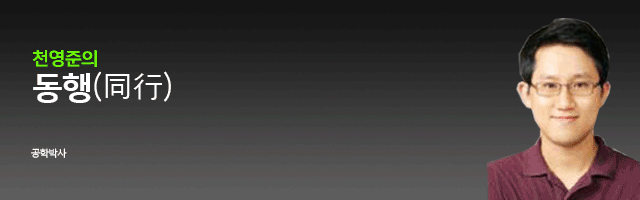아마도 필자가 대놓고 쓰는 첫 번째 ‘경영과 정치’ 칼럼이 아닌가 싶다. 이 칼럼 이후로 비슷한 형태의 글을 그만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근원적 실패가 이런저런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원인이 단순하다.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정권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권 창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한 최순실 일당이 정부의 주류가 되었고, 창업에 기여한 공신들은 제각각 무리 밖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야당으로 쫓겨 가는 상황이 연출된 지 오래다.
이런 사례는 춘추전국기 망국의 길을 걸었던 오(吳)나라나 초(楚)나라 등에서 여럿 볼 수 있다. 지도자에게 진심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는 가차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국왕과 혈연 공동체로 묶인 세족(世族)들이 약탈 경영을 하는 사회로 전락했던 것이다.
급기야 능력 있는 인재, 즉 기려지신들은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념과 의리와 별도로 상대국을 향한 전략을 조언하게 됐고 이를 가리켜 종횡가(縱橫家)라고 일컫게 되었다. 어떤 중국 철학자는 제자백가(諸子百家) 전체가 종횡가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사실상 천하를 주류하며 자신의 전략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동질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무더기로 낳은 게 진(秦)나라를 제외한 6국의 실패였고, 진에게는 성공 원인이었다. 그들을 데려다가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 거침없었던 진은 상대방의 약점을 활용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정책을 통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그런 진에서도 전문가를 이용한 경영이 정말 어려웠다. 법가 정책을 도입한 상앙(商鞅)은 여러 세족들의 모함과 혜문왕의 의심을 받아 ‘거열형’에 처해진 사례가 되었고, 그 이후 소양왕 당시 재상이 되었던 외국 출신 인사 범수(范睢)도 초나라 출신 귀족들의 견제를 물리쳐야 했다. 범수가 장기집권하며 정치적 모순을 드러내자 채택(蔡澤)이 건너와 객경(客卿)으로 영입, 재상의 자리에 올랐는데, 채택이 처음 범수를 만나 지적한 것도 ‘당신은 전문가로서 진에 등용되었지만 결국 세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경고였다.
제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들도 오랫동안 지도자를 모신 ‘문고리’들의 견제를 받게 마련이고, 주류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고리’가 되어 새로운 인재의 진입을 방해하는 상황. 이래서 전문가를 이용한 경영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비슷한 케이스가 박근혜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잘 아는 디자이너들은 결국 또 다른 의미의 기려지신이 되어 다른 곳을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 일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수층 전반에 걸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기에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지도 모른다.
막연한 ‘정신승리’적 자세도 전문가 기반 경영에 해가 된다. 상앙이 진의 재상이 된 이후, 인접 강대국이었던 위(魏)와 대적할 만큼 진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상앙은 위나라에서 공숙좌의 천거로 중서자(中庶子, 태자의 비서 조직이자 교육 전담관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내 부속행정관쯤 되겠다)로 일하며 승상이었던 공자 앙(仰) 등과 교분이 있었고 위 혜왕(惠王)과도 안면이 있었다. 상앙은 위나라 조정이 전형적인 이권 집단이자 정신승리형 조직임을 알고 있었다.
경영학자 마이클 해넌에 따르면 오래된 조직, 규모가 큰 비대 조직일수록 저 나름의 구조화된 관성(Structured Inertia)이 있다. 이 관성이 생기는 이유는 오래된 관행을 철폐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우려, 전통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는 자들의 오만 등이다. ‘하던 대로 해야 한다’는 제도적 믿음도 문제가 된다.
상앙이 이런저런 전략으로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끌고, 위나라와 접변한 하서(河西, 황하 서쪽의 분지)를 공략하는 사이, 위나라는 ‘그래봐야 위의 중서자였던 상앙이 이끄는 진나라’라며 정신승리하기에 바빴다. 결과는 위나라의 참혹한 패배였고, 혜왕(惠王) 이후로 위나라는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걸으며 나중에는 북서쪽의 안읍(安邑)에서 동쪽 대량(大梁)으로 수도를 옮겨 국가가 쪼그라드는 곤욕을 맛봐야 했다. 지금의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과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
전문가 기반 경영은 용군(庸君, 중간 수준의 리더)이 지배하는 국면에서도 전체 조직이 잘 돌아가는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운영 방법이다. 한비자(韓非子)가 강조한 대로다. 최고의 조직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가려 뽑고, 그에게 제대로 된 권한과 인센티브를 주어 위임하고, 오직 결과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신상필벌(信賞必罰)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 전문가가 세족(世族)화되는 상황과 세족이 전문가를 막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는 지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비리와 적폐를 제때 드러내고, 나중에 몰아닥칠 충격을 차츰차츰 완화하며 시스템을 자정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보수세력 전체의 리스크로 작동하게 된 원인도 사정제도에 안이한 박근혜 정부의 태세 때문이라는 내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조금씩 문제를 개선해 나갔다면 실망감이 덜했을 텐데, 갑자기 몰아닥친 충격 때문에 거의 파산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비자도 지도자가 수시로 ‘합법적 숙청’을 감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리더십에 해가 되는 부패한 권귀(權貴)들을 제때 도려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후보들 중에 진(秦)과 같이 체계적인 조직을 수립한 인물이 있는가? 답은 ‘없다’이다. 이유는 정권 교체라는 과실을 차지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뿐, 어떻게 그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이며 이후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도자의 혜안이 작동해야 한다.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기용하는 자세다.
진나라 효공이 쓴 상앙, 소양왕이 쓴 범수, 혜문왕이 썼던 장의 같은 사람들은 좋은 프로필과 별도로 실력으로 자신을 입증했던 사람들이며, 작게나마 정권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실험’을 해본 인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문제를 해결하는 혜안이 있었다. 여기에 전문가 기반 경영의 실마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