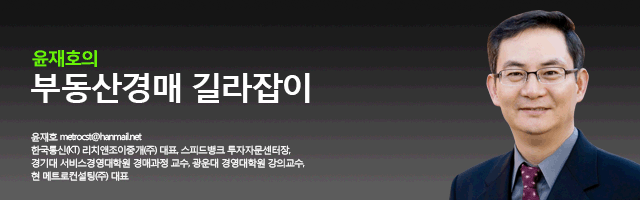경매 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비록 위험을 안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공략하면 시세보다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싼값이란 최소 10%에서 최대 30~40%까지 싼 것을 의미한다. 물론 부동산 시장 흐름과 추이에 따라 낙찰 가격의 변동은 심한 편이지만 투자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얼마든지 저가 매입이 가능한 것이 경매 시장이다.
값싸게 낙찰받으려면 나름대로 전략과 기술, 실전 경험이 두루 필요하다. 무턱대고 남들이 선호하는 인기 아파트만 고른다면 낙찰받기 쉽지 않은 데다 경매의 장점인 저가 매입은 물 건너 갈 수 있다. 한 푼이라도 값싸게 사기 위해 경매 아파트를 찾는 만큼 경매에서 값싸게 사는, 돈 되는 노하우들을 공부해 보자.
첫째, 틈새 물건을 찾는 일이다. 남들이 잘 찾지 않는 물건, 입찰을 자제하는 경매 아파트는 인기 있는 아파트보다 평균 20~30%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바로 주상복합, 빌라형 아파트, 소규모 단지(단동짜리) 아파트, 외곽지역 아파트, 비역세권 아파트, 대형 아파트,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지은 지 오래돼 외관이 허름한 아파트, 비인기 지역 아파트, 다소 권리상 허점이 있어 보이지만 추후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파트가 바로 그 대상이다.
이 같은 아파트를 잘 골라 매입하면 짭짤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다. 일종의 아파트 경매의 틈새 투자처인 셈이다. 흔히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값싸게 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투자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싶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이고 시세보다 값싸게 사려면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수밖에 없다. 값싸게 매입한 만큼 나중에 되팔 때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값에 매물로 내놓는다면 쉽게 되팔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돈이 되는’ 연구를 해보자. 서울중앙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D주상복합 251㎡ 아파트 낙찰 사례를 놓고 보자. 96년 11월에 지어진 19층 규모의 주상복합 중 10층에 있는 아파트다. 필자가 아는 J 씨는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하는 50대 중반의 무역업체 사장. 이 아파트에 J 씨 친구가 살고 있는데 친구 집에 드나들다 보니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다.
가진 돈은 많지 않고 일반 매물도 워낙 비싸게 나오니, 경매로 꼭 낙찰받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감정가 6억5000만원에서 두 번이나 유찰돼 최저 경매가격이 4억1600만원(감정가의 64%)으로 떨어졌다. J 씨가 2명의 입찰 경쟁자를 제치고 4억705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아파트는 강남역에서 가깝지만 주변에 중소 주상복합 건물이 모여 있는 곳이다. 진흥아파트 같은 아파트 단지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었다. 주상복합 건축 붐이 일 때 이 일대에 5개 정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져 단지 형태로 조성된 곳이었다. 낙찰받고 다시 현장을 찾아가 보니 소음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했다.
입찰 전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분석해 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최초 저당권은 우리은행 부천지점에서 채권최고액 7억2000만원에 설정한 것이었다. 이후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근저당과 가압류 몇 건을 설정했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 모두 소멸하는 권리였다. 등기부등본상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었다. 세입자 관계 또한 소유자 겸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 명도에 애로가 없었다.
대단지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상책
그러나 낙찰받고 소유자를 만나 보니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거주하고 있던 소유자는 자신이 예전에 D그룹 회장의 직속비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한 후 가진 돈 몇 억원과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경험 없이 무리하게 사업하다 빚을 많이 져 이렇게 경매까지 넘어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 2000만원의 이사비를 챙겨줘야 한다며 떼를 썼다. 그 금액 이하로는 집을 비워줄 수 없으니 강제집행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막무가내식 행동을 했다.
그러나 수회에 걸친 면담과 낙찰자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끈질긴 회유에 그 소유자는 한풀 꺾였다. J 씨가 1000만원의 이사비와 체납관리비 7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을 순순히 비워줬다. 필자는 이 소유자가 마지막으로 집을 비워 주면서 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 집이 되지 않으려 했던지 처음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첫 느낌이 안 좋았다”며 “잠을 자도 거의 매일 피곤했다”고 그는 되뇌었다. 세 식구가 사는 집인데 집이 너무 넓은 데다 사는 내내 자꾸 악몽을 꾸게 되었다고 했다.
필자는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집’ 또는 ‘고가의 집’에 살게 되면 이렇게 사는 내내 고통을 느끼다가 이내 경매로까지 넘어가는구나 생각했다. 경매 일을 하면서 명도를 할 때 느끼는 점이 하나 있다. ‘집 주인이 졸부’였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큰 집에 살거나, ‘과다한 대출을 얻어 무리하게 산 집’의 주인은 공통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다 사업 또는 직장 일도 지지부진해져 결국 이렇게 최후(경매)를 맞이한다는 생각도 해봤다.
J 씨는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주상복합을 틈새로 겨냥했다가 당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 일반인들이 경매에서 아파트를 찾을 때는 주로 단지가 크거나 브랜드 아파트만을 고집한다. 그러나 이렇듯 도심의 다소 오래된 주상복합의 경우 투자자가 많지 않아 낙찰가와 입찰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지금도 여전히 낮은 경쟁률과 저가에 낙찰되는 게 통례다.

‘복잡한 물건’에 돈이 숨어 있다
아파트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큰 욕심을 버리고 내 자금과 내 몸에 맞게 ‘소박한’ 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가 매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둘째, 다소 복잡한 권리물건인 듯 보이는 매물이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인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경매 아파트는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이다. 예를 들어 입찰 당시 등기부상 대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지만 감정평가서에 대지권을 포함해 감정했다면 하자 없이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물건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투자를 꺼리지만, 투자경험·법원판례·전문가 조언 같은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입찰한다면 아무 하자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감정가를 잘 살펴보면 저가 매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시세보다 낮게 잡힌 감정가를 이용해 남보다 한발 앞서 입찰에 참여하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뚫지 않고 한결 수월하게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매물은 사건번호를 보면 된다. 2016년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인데 사건번호가 2014~2015타경으로 시작되는 사건이라면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을 때 감정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물건은 첫 경매에서 수천만원이나 억대 정도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다. 이 ‘타경’ 앞에 붙는 숫자는 경매가 법원에 접수된 연도다.
보통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오려면 짧게는 경매 신청 시점에서 3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 채무자 같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과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후 경매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이때 시세가 낮게 형성된 시점에 감정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저평가돼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는 감정가 자체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낮게 경매에 부쳐지기도 한다.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첫 입찰에서 바로 입찰해야 ‘시간차 공격’으로 저가 매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매물인데도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 입찰한다면, 한 마디로 ‘꽉 막힌’ 경매투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