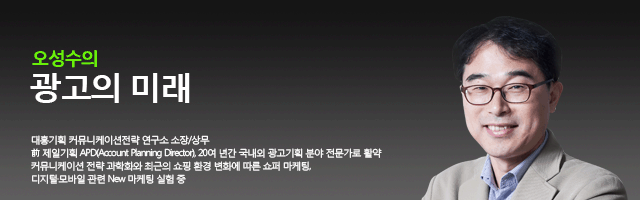“아,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 모든 ‘먹는다’는 동작에는 비애가 있다. (…)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저리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후배가 푸념처럼 우리의 광고 비즈니스가 ‘앵벌이 비즈니스’가 아니냐는 자조 섞인 얘기를 꺼냈을 때 참 무람한 느낌이 들었다. ‘앵벌이 비즈니스’란 갑 광고주에게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 수수료로 수익을 보전하는 을 광고대행사의 비즈니스 방식을 폄하하는 뜻이었다. 최근 리베이트니 전근대적인 거래관행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더욱 이런 자조 섞인 말을 입에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뇌리를 스쳤던 글귀가 바로 김훈의 <밥벌이의 지겨움>이다. ‘앵벌이 비즈니스’의 처연함을 가장 절절히 대변한 글귀가 따로 없는 것 같다. ‘밥벌이’ 대신 ‘앵벌이’로 갈아 끼워도 그 무람한 정서는 쉬이 통할 듯하다. ‘밥’을 ‘광고’로 치환해도 그 치열한 또는 처절한 비즈니스는 이미 ‘밥’의 반열에 자리할 정도가 아닐지? 그래서 ‘사람들을 내몰아 ‘광고’를 벌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잠깐 김훈式의 대책 없는 ‘허망주의(?)’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자꾸 생각할수록 허망하기 이를 데 없어 자꾸 속이 허해지는 것이었다. 꼭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가? 이런 ‘밥벌이’는 숙명인가? 마음 한켠에서 누군가가 호기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김훈의 밥벌이는 ‘월급쟁이’란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한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글쟁이’의 숙명론 아닌가?(김훈 선생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의 숙명론은 숙명론대로 지극히 옳고 정서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광고의 ‘앵벌이’도 갑과 을의 관계에 구속된 ‘광고쟁이’란 숙명으로 받아들이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하는, 자조와 연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 한켠에서 그는 더 필자를 다그쳤다. 지나친 단순화일지 모르지만 ‘앵벌이’의 비애는 광고인들 당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광고 수주를 위해 ‘모든 것’을 서비스화 해버리는 ‘저자세’ 비즈니스 관행, 그리고 그런 관행으로 어쩔 수 없이 몰고 가게 하는 광고대행사간 경쟁, 그런 것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었다. 스스로 갖고 있는 솔루션이나 플랫폼 없이 거래를 ‘대행’하는 중개자 자리에 머물다 보니, 또는 거기에 만족하며 주저앉아 살다 보니 ‘앵벌이’식 비즈니스만 고스란히 남은 것 아니냐?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다른 방식으로 ‘밥벌이’를 하는 존재들(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튀어나오니 ‘앵벌이’ 비즈니스조차 날아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냐? 그는 참으로 인정사정없이 필자를 몰아세웠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의 문제제기를 곰곰이 되씹어보았다.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등의 무형적 가치는 큰 재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페이스북, 구글 등 요즘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출발이 다 그랬다. 그런데 광고대행사에서 산출하는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는 왜 제대로, 당당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광고비와 광고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이 모든 것이란 ‘대행사’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Be Between’ 관계에 머물 뿐 ‘Go Between’의 촉매적, 적극적 가치창출자 존재로 ‘Disruption’하지 않기 때문이다. ‘Go Between’의 적극적 역할은 예를 들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구현한 솔루션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 재산권(IP)으로 보호하며 비즈니스가 실행될 때 발생된 수익은 ‘광고 수수료’와 별도로 보상받는 식이다. 그런 ‘당당한’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권리가 될 수 있게 할 치밀한 시스템과 운영방식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 요즘 여러 광고주들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광고대행사와 Win-Win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건강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메인스트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 뭐든 괜찮은 것이 나오면 앞뒤 안 가리고 광고주에게 들고 가기 바쁜, 업계 속어로 ‘광팔이’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영업 방식으로 퇴행하면 우리의 권리가 될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광고캠페인 서비스를 더욱 가치 있게 해주는 깜찍한 ‘부가서비스’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 후배는 이제 너무 민낯을 드러낸 ‘솔까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끔은 뒷걸음질 치려는 퇴행을 솔직히 마주해야 탄탄한 앞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영어 문장을 접한 적이 있다. ‘Running in the wrong direction is slower than walking in the right direction.’ ‘앵벌이’ 비즈니스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뒷걸음치기엔 광고의 판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좁아지는 판 위에서 ‘기존 방식’대로 달릴 것인가? 새로운 판 위에서 여유롭게 걷는 새로운 꿈을 꿀 것인가? 그가 함께 새 길을 찾자고 계속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