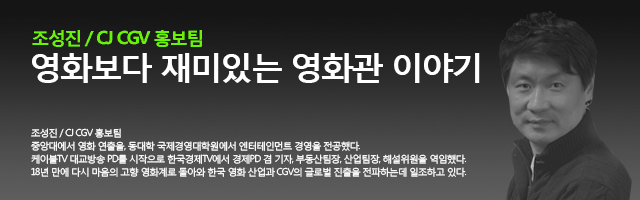B 씨는 영화 마니아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찾은 것이 꽤 오래된 것 같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서너 번은 극장을 찾았는데, 최근엔 주로 집에서 영화를 본다.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 집안에 홈시어터를 꾸몄기 때문이다. 70인치 TV, 5.1채널 오디오 시스템에다 소파형 의자를 설치하고 나니 프리미엄 영화관이 부럽지 않다. IPTV를 통해 최신 영화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B 씨를 즐겁게 한다.
영화가 탄생한 이래 관람의 중심은 역시 극장이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영화를 극장에서만 본다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극장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접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IPTV다. 좀 오래된 영화는 무료로 얼마든 관람이 가능하고, 최신 개봉 영화라 하더라도 1만원이면 편안하게 TV를 통해 볼 수 있다. 일부 영화의 경우 극장 개봉 후 1주일이면 IPTV에 걸린다. 가정의 TV 크기도 눈에 띄게 커져 요즘은 50, 60인치대 TV가 일반화되고 있다. 굳이 영화관에 나오지 않더라도 안방에서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글로벌로 시야를 확장하면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빠르게 안방 극장을 파고들었다. 이들 업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영화에 투자함으로써 극장을 거치지 않고 안방을 통해 먼저 개봉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 <옥자>다. 넷플릭스로부터 5000만달러를 투자받은 이 영화는 극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먼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트리밍 업체들이 영화산업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화의 개봉 방식 자체를 바꿔가고 있을 정도다. 기존 방식은 제작된 영화를 가장 먼저 극장에서 상영한 후 IPTV나 DVD를 통해 2차 시장을 형성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은 그 이후에 보는 것으로 통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은 영화산업 생태계 내에서도 거의 마지막 단계였다. 하지만 이제 자체 영화 제작은 물론이고 신작 영화를 극장 개봉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유료 상영하는 ‘온·오프 동시 개봉’까지 담당하면서 이들 스트리밍 업체들은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크리닝 룸(Screening Room)’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까지 등장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크리닝 룸은 신작 영화를 극장 개봉 시점에 온라인으로 유료 서비스하는 상품이다. 영화 한 편당 50달러를 내면 48시간 동안 관람이 가능하고, 여기에 더해 극장 티켓 2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극장업자들과 영화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극장 사업자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다. 영화관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가정에 묶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영화제작자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극장과 온라인 양쪽 모두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스크리닝 룸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화감독들 역시 양쪽으로 나뉜다. 일부는 여전히 영화관을 통해 영화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 입장에서는 영화를 보러 오지 않는 고객까지 영화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각자의 입장이 어떻든 스크리닝 룸 서비스가 영화 관람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듯하다.
모바일 환경은 또 어떠한가? 대세로 자리 잡은 모바일의 확산 역시 영화관으로 향하는 관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요소다. 스마트폰의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길들여진 관객들에게 러닝타임 2시간 이상인 장편영화는 길게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를 보는 절대 공간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극장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극장이 결국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론이 등장한 지 오래다. 이제 극장을 지어만 놓으면 관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시대는 끝났다. 뉴미디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극장들은 극장에 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