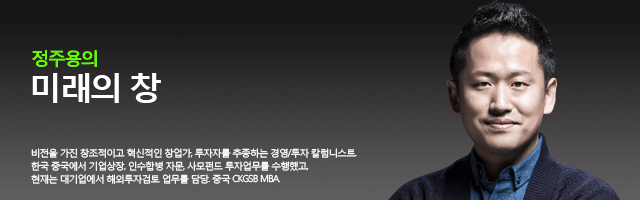“회장님이 전사적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자사에 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을 어떻게 누가 해야 하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요.”
[컨설턴트의 답변]

필자도 처음에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왜 힘들어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기업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답이 있습니다. 위기관리와 그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은 실행하는 동시에 그 주체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지시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회장 및 최고경영진은 자사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나 첩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 구체적으로 찍어 설명해주긴 뭐하지만…’ 다가오는 그런 류의 위기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회장 및 최고경영진이 감지하고 있는 그 ‘위기’란 어떤 것일까요?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은 실무그룹이 “회장님, 혹시 감지하신 위기라는 게 A 관련인가요?”라 물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한 임원이 실무그룹에게 ‘A를 포함해 봐’라는 간접적 언질을 주지 않는 이상은 구체적으로 감지된 위기 유형을 실무그룹은 알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시작됩니다. 사내적으로 대규모 위기요소 진단을 진행하기도 하죠.
실무그룹이 고생해 자사에 발생 가능한 주요 위기유형을 여럿 도출했다고 치죠. 그 리스트를 정리하는 데도 이 ‘정치적 부담’은 작용합니다. 상위 다섯 A들이 회장 및 경영진만 아는 대외비적 문제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적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지 않겠어… 당연하지’하는 주제들입니다. 실무그룹이 이 주제들을 보고하며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위기유형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민감한 유형들은 뒤로 좀 밀어놓고, 실무그룹에서 해결해야 할 일반적 위기유형들이 상위로 올라가곤 합니다. ‘정치적 부담’의 결과죠.
일부 최고경영진이 회장의 감지 내용을 이해하고 “A라는 위기유형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세요”라 했다고 해보죠. 실무그룹은 더더욱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그 위기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죠. 그 내용을 알아야 대응 방안과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짤 텐데 위기 자체에 대한 내부 정보가 없습니다. 실무그룹이 그 내용을 알려면 기획, 감사, 재무팀 등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한데, 그들이 자신의 목숨(?)과 같은 비밀내용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맡은 실무그룹과 공유할 리 만무하죠.
어쩔 수 없이 실무그룹은 A라는 위기유형 ‘일반’을 상상하면서 대응 방안을 만듭니다. 타사들에게는 유사한 A 위기유형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조사하죠. 그 감지는 어땠고, 초기 대응 방식들은 어땠는지 궁금해 합니다. 마치 같은 병을 앓은 여러 타인들만 진맥하면서 자기 자신의 병을 간접 진단하고 치료하려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이 ‘정치적 부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대응은 현 시점에서 A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발하지 않도록 ‘발생 방지’를 하는 것인데요. 실무그룹이 생각하는 것보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들 핵심이 움직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죠. 이 절실하고 중요한 요청을 대응 방안이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대응방안도 실무 차원에서 가능한 ‘일반적’ 방식들로만 구성됩니다. 곧 15m짜리 쓰나미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5m짜리 방파제를 쌓은 형상이죠. 실무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실제 A라는 거대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회사 실무그룹이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할까요? 대부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동하더라도 효과가 모자랄 것입니다. 무언가는 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뛰쳐나온 열 명의 어린 아들 딸들이 집 주변을 뛰어 다니며 불이야 소리만 지르는 모습과 같아집니다.
오랜 시간 후 위기가 마무리되어 내부적으로 살아남은 임직원들이 ‘왜 우리가 실패했나?’하고 평가하게 되면 어떤 의견이 나올까요? 이때도 ‘정치적 부담’은 살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위기관리 시스템이 형편 없었다!”로 끝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인 ‘상위 1%’가 곧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 품질이 곧 시스템의 품질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은 그 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