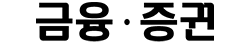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하게 됐지만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돼 앞으로도 외환·교역정책에 개입받을 여지가 커졌다.
29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이 지난해 도입한 교역촉진법에는 없는 개념이다.
이 법안은 어떤 국가가 3가지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 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한 규모(2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한 해에 GDP의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린 경우 등이다.
미국이 관찰대상국이란 개념을 만든 이유는 이들 국가가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지만 2개씩을 충족하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283억 달러)와 경상흑자(GDP의 7.7%)에서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달러 순매수는 GDP의 0.2%에 그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원화 가치 급등이 우려될 때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2차례(4월, 10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를 절상하고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은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며 “외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