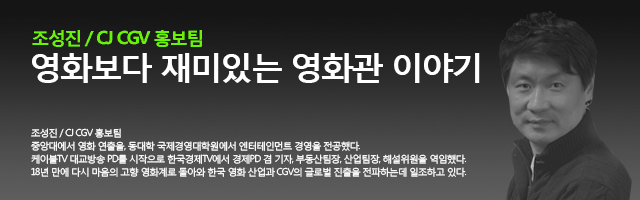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홍콩 영화 <영웅본색>이 재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영화관으로 향했다. 학창 시절 가슴 설레며 <영웅본색>을 관람했고, 지금은 어딜 가나 내 인생의 영화로 주저 없이 이 영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 씨는 당시 홍콩 영화에 열광했다. 시도 때도 없이 동네 동시상영관에 드나들었다. 지금도 <영웅본색>과 <천녀유혼> 두 편의 영화를 함께 보며 행복해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윤발, 장국영, 왕조현 등 가슴을 뛰게 했던 배우들을 영화관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최근 극장가에 불기 시작한 재개봉 열풍. 적게는 몇 년 전, 많게는 수십 년 전 개봉했던 과거의 영화들이 대거 영화관에 걸리며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개봉’이란 말이 지금은 옛날 영화를 다시 본다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과거 단관 극장 시절에는 다소 다르게 쓰였다.
한국 영화의 전성기라고 알려진 1960년대 이후 극장에서의 영화 상영 단계는 대체로 3단계로 나뉘었다. 영화 한 편이 극장에 걸릴 때 가장 먼저 ‘개봉관’이라고 불리는 시내 중심의 극장에서 개봉한다. 단성사, 피카디리, 명보극장 등 대부분의 개봉관은 종로나 충무로 등지에 위치했다. 개봉관 스크린 한 개에서 많게는 천 개 이상의 좌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기대작이 개봉하는 주말이면 밀려드는 인파로 주변은 엄청난 혼잡을 겪기도 했다. 영화를 홍보하는 수단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라 스포츠신문에 개봉 영화 소개가 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개봉일 성적이 확 달라지기도 했다.
개봉 후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영화는 시 외곽의 ‘재개봉관’으로 넘어갔다. 개봉관에 걸린 영화가 재개봉관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이 적게는 몇 주, 많게는 한두 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재개봉관을 통해 어느 정도 관객을 모으고 나면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시상영관’이었다. 동시상영관은 인기 있는 두세 편의 영화를 모아 교차 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영화 한 편 값으로 두 편을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이 마감되고 비디오 등 2차 판권 시장으로 넘어갔다.
1993년, 한국 영화 최초로 서울 103만 관객을 동원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의 경우 종로 단성사에서 처음 개봉했다. 이 한 곳에서만 6개월간 상영하면서 83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나머지 20만명 정도의 관객은 재개봉관이나 기타 다른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이다. 1997년 추석에 개봉해 당시 서울에서만 7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장윤현 감독의 <접속>. 개봉 당시 서울에서 확보한 개봉관은 단 6개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30개가량의 스크린을 확보하는 게 고작이었다.

영화가 개봉관, 재개봉관, 동시상영관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다 보니 다소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 우선 디지털이 아닌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다 보니 상영관을 무한정 늘리기가 힘들었다. 비용 문제 때문이었다. 지금도 영화에서 광고와 마케팅에 드는 돈을 ‘P&A 비용’이라고 하는데 P는 Print, A는 Advertise를 뜻한다. 스크린 10개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필름 10벌이 필요했고, 100개에서 상영하기 위해서는 100벌이 필요했다. 영화 편수가 늘어날수록 필름 프린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프린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지금과 비교하면 그만큼 영화 한 편이 여러 개의 스크린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 하나 아날로그 형태인 필름은 반복해서 상영할수록 화질이 손상됐다. 첫 개봉관에서는 비교적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었지만 상영이 반복될수록 스크래치가 생겼다. 재개봉관을 지나 동시상영관으로 넘어갈 즈음이면 필름 상태는 최악이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보면 필름의 스크래치가 고스란히 스크린에 드러났다. ‘영화에 비가 온다’는 표현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