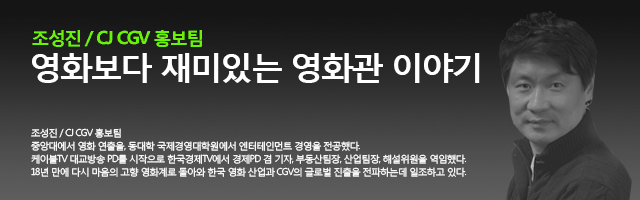1995년 당시 제일제당 이재현 상무와 이미경 이사는 미국행 LA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영화 <ET>로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 왕국을 꿈꾸던 제프리 카젠버그, 음반업계의 거장 데이비드 게펜이 함께 만든 ‘드림웍스SKG’에 투자 계약을 하기 위해서였다. 제일제당은 3억달러를 투자하며 드림웍스SKG의 대주주로 참여했다. 당시 제일제당 연매출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을 미지의 산업에 쏟아 붓는 모험을 강행한 것이다.
당시 이재현 상무는 “이제는 문화야! 이게 우리의 미래야! 단순히 영화 유통에 그치지 않고 멀티플렉스도 짓고, 영화도 직접 만들고, 음악도 하고, 케이블채널도 만들 거야.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는 거지”라며 이미경 이사에게 했던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다.
문화산업에 투자를 결심한 제일제당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은 영화였다. 특히 멀티플렉스는 제일제당이 추구하는 플랫폼 전략의 핵심이었다. 영화관을 설치해야 영화 제작이 늘어나고, 이는 곧 영화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태어난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가 바로 1998년 문을 연 ‘CGV강변11’이다. CGV라는 이름은 한국의 제일제당과 홍콩의 골든하베스트(Golden Harvest), 호주의 빌리지로드쇼(Village Roadshow) 등 3개 합작사의 맨 앞 글자를 따서 붙였다.
당시 영화를 보기 위해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종로를 위시한 서울 중심가였다. 단성사, 피카디리, 스카라, 명보극장 등 내로라하는 대형 극장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CGV강변11이 들어선 곳은 종로와는 한참 떨어진, 영화관 입지로는 다소 의외의 지역이었다.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위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CGV강변11은 관람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서비스 수준의 차별화를 무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고급스러운 카펫과 인테리어, 다수의 스크린과 외식 공간 등 가족과 연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개관 첫 해에만 무려 350만 명에 달하는 관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CGV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뒤를 이어 또 다른 멀티플렉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 등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개인 극장들 역시 빠르게 멀티플렉스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일부 개인 극장들은 대기업 중심의 멀티플렉스에 대항하기 위해 ‘시너스’ 같은 별도의 브랜드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멀티플렉스의 기원은 어디였을까? 다름 아닌 1963년 미국 캔자스 시티에 문을 연 ‘AMC 파크웨이 트윈(Parkway Twin)’이다. 이름 그대로 한 개의 상영관을 두 개로 쪼개 쌍둥이 형태로 만든 영화관이었다.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했다. 당시 AMC 극장의 CEO였던 스탠리 더우드(Stanley H. Durwood)는 “단관 공간과 일정한 종업원 수로 두 개의 스크린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동일한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겠다는 지극히 경영자적인 마인드가 오늘날 멀티플렉스의 시초가 된 셈이다. 파크웨이 트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AMC는 1966년 4개 스크린, 1969년 6개 스크린을 설치한 본격적인 멀티플렉스를 선보이게 된다. 일반 단관 극장에 비해 뛰어난 효율성,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어우러지며 멀티플렉스는 영화관의 대세로 급부상하게 된다.
전 세계 멀티플렉스가 탄생한 지 이제 겨우 반세기, 한국 멀티플렉스는 그보다도 짧은 20년도 채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멀티플렉스의 공과(功過)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멀티플렉스는 고객과 직접 접점에 있는 플랫폼으로서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영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영화를 산업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멀티플렉스의 생성과 성장은 곧 전 세계인의 가슴을 사로잡은 수많은 명화 탄생의 역사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