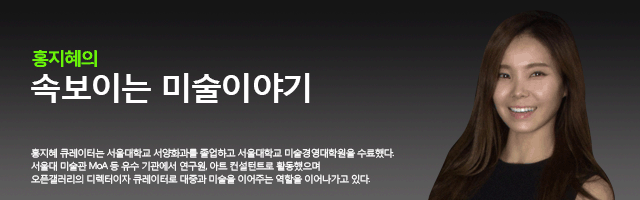▲ 홍지혜 오픈갤러리 디렉터&큐레이터
미술학도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두 가지다. “그림 하나만 그려줘.”, “그림은 너무 어려워.” 순수미술을 공부했을 때는 주변에 그림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갤러리 디렉터로서 그림을 설명하는 입장이 되니 그림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림을 좋아하고 또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그의 책 <구별짓기(La Distinction 1979)>에서 사람들은 문화와 취향 측면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자신이 속한 그룹의 취향을 만든다고 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소비는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룹에 영향을 받고 준다. 그는 이런 취향을 이루는 성향을 ‘아비투스(Habitus)’라고 정의했다. 강남에 사는 것과 홍대에 사는 것, 명품을 입는 것과 스트리트 패션을 입는 것, 오페라를 보는 것과 비보이 공연을 보는 것, 골프를 치는 것과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 모두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 짓기’ 위한 그 그룹의 아비투스인 것이다.

다양한 이유에서 그림 한 점 소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어떤 작품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그림은 너무 어렵고 미술 취향이 딱히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술은 오랜 기간 상류층의 아비투스였다. 그리고 아직 미술을 감상하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의 고상한 취미나 경제적 특권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미술 작품을 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술은 자신과 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나는 이런 작품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괜한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미술에 있어 취향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필자는 미술에 딱히 취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각적 취향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쇼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똑같이 생긴 넥타이지만 색깔도 패턴도 매우 다양하다. 그 수많은 넥타이 중에 사람들은 자기만의 ‘취향’을 가지고 하나의 넥타이를 선택한다. 단순한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려한 패턴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접시를 살 때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모양의 접시를 사더라도 누군가는 티끌 하나 없는 흰 접시를, 또 누군가는 꽃잎이 그려진 접시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자기만의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미술 작품은 넥타이나 접시처럼 단순하지 않다. 미술 작품은 시각적 언어에 작가의 철학적 사유나 개념이 동반된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작품이 있다. 이런 작품들에 대해 ‘그냥’이라는 이유부터 시작해 ‘파란색이 좋아서’, ‘마음이 편해져서’ 등의 단순한 이유를 붙여보자. 이렇게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미술 취향이다. 관심 있는 작품이 생기면 그것을 그린 작가의 생애와 다른 작품, 나아가 비슷한 화풍의 작가에 대해 찾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취향은 점점 견고해진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상류층의 고상한 취향이나 경제적 특권이 아니다. 정답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단순한 끌림에서 시작해서 호기심으로 자기만의 취향을 만드는 것이다. 미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어렵고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감상은 옳고 그름이 없다. 취향은 어느 순간에도 틀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