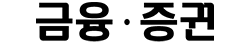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7.5%~10%의 고금리로 신용대출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시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장사를 통해 메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거래 및 예탁증권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래대금 기준 10대 증권사의 올해 신용거래융자 평균 대출금리가 7.93%로 나타났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 주식 매매거래를 위해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2012년 8.13%, 2013년 8.05%, 2014년 8.09%에 비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가파른 속도로 떨어진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더딘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일곱 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 수준이다.
반면 상위10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은 상반기 1조202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5.6% 증가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거래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놀이로 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키움증권(10.1%)이었고, 대신(8.2%), 미래에셋(8%), 한국투자증권(7.98%), 하나금융투자(7.52%), 신한금융투자(7.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 금리조정 없이 8%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금리를 올린 곳도 있었다. 한국투자는 2013년까지 7.5%를 받다가 지난해에는 금리를 8%로 인상했다. 한국투자는 올해 5월이 돼서야 겨우 0.1%p 인하했다.
2012~13년 7.3%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대투도 지난해 7.5%로 인상했다가, 올해는 7.8% 수준의 금리를 받고 있다.
금리가 가장 높은 키움증권도 지난해보다 0.13%p 평균금리가 상승했다. 주식시장 호황을 틈타 증권사들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손실위험이 훨씬 낮다. 신용거래융자는 고객이 매수한 증권을 담보로 잡고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5000만원의 자금을 가진 A씨가 5000만원을 빌려 총 1억원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5000만원의 140%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계좌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담보(마진콜)를 받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기준금리가 일곱 차례나 내렸는데 증권사들은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누려야 할 금리인하의 혜택을 증권사들이 독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달금리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금리 감독을 포기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금리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