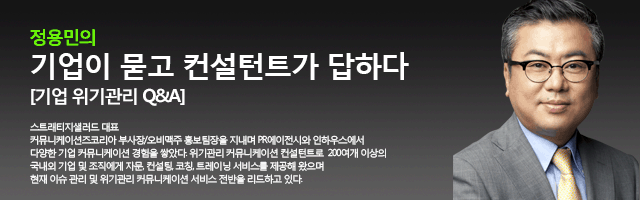[기업의 질문]
“최근 저희에게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저기 기자들이 전화를 해오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대더군요. 기자들이 팩트를 잘 취재해서 질문하든가, 이건 모두 추측이나 어디서 들었다 하는 이야기로 답변을 억지 유도하거든요. 언론이 이래도 됩니까? 이슈가 터져서 정신도 없는데 이런 수준 낮은 질문들에 우리가 계속 답변해야 하는 건가요?”
[컨설턴트의 답변]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 하는 것은 곧 코멘트로 해석됩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코멘트로 인식되는 거죠. 이슈 관리 시에 소통을 소모적으로 보기보다는 가장 생산적인 이슈 관리라고 보는 것이 회사에 더 이롭습니다.
같은 답변도 계속 반복해야 하고요. 가능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회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공격적인 질의·응답 훈련을 받은 임원 및 팀장들이 흰머리가 한 움큼 늘었다는 호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며 소통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한 전략적 이슈 관리 활동으로 권장됩니다.
‘(기자의)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문제로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질문이 질문 같은 질문이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냐 하는 것은 취재를 받는 기업 측에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기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나의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자의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 기자가 던지는 덫일 수도 있고요. 기업을 대변하는 답변자는 기자의 질문 하나 하나에 동일하게 집중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변인은 그래야 합니다.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종종 질문을 받는 회사만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TV 보도를 보는 시청자들이나 신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맞아, 기자의 질문 같은 시각도 있는데, 그에 대한 이 회사의 입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회사 측에서처럼 ‘구태여 그런 질문을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나?’라고 보는 것과는 다르죠. 이 다름을 인정한다면 기자의 질문은 ‘말이 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대변인들이 기자의 질문에 가끔 이런 답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는 “전혀 근거 없는 루머나 추측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이런 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이 유효하려면 해당 질문이 여러 기자들 사이에서도 ‘설마 그게 사실이겠어?’라고 느끼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변인의 그런 답을 듣고 ‘아이고 창피해…. 괜히 물어봤나?’라고 기자 스스로 느낄 수 있을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 질문이 유효하다 생각하는 기자가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재질문 할 것입니다. “대변인께서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설전이 벌어져야 하거나, 답변을 끝까지 회피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결국 최초 답변은 성의 없었던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대변인은 기자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직업이 기자라면, 답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대변인입니다. 질문이 기자의 충분하지 않은 취재에 근거하거나, 기자 개인의 추측이나 억측 또는 때때로 억지에 근거하는 질문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답변을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다.
백 번이나 천 번을 물어도 정해진 답변을 연결해 반복하고 연결해 반복하는 전문가가 훈련된 대변인입니다. 대변인들이 기자를 평가하듯, 기자들도 대변인을 평가합니다. 기자가 취재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면, 대변인은 답변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상호 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는 이런 팽팽한 구도에서만 생성 가능합니다. 이슈 관리 시 버려도 될 기자의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