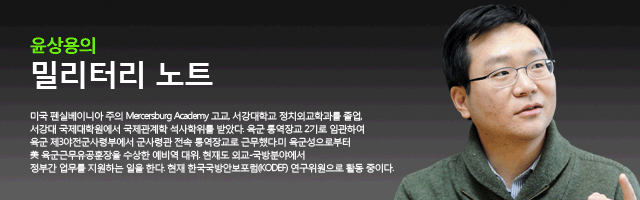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전장 위의 신무기는 열세에 처한 군대를 한순간에 승기를 잡도록 해주는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 물론 생산력과 적절한 투입 시기 그리고 독창성의 여부가 전세를 뒤집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발한대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한 상당수의 발명품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많이 볼 수 있다. 독일은 자원의 고갈과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신무기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연합군 역시 전 유럽이 전쟁터가 된 상황에서 최대한 전쟁을 조기 종결시킬 목적으로 마찬가지 시도를 했다. 이 시기에 개발됐으나 실전화되지 못한 흥미진진한 무기류의 일부를 살펴볼까 한다.
►박쥐 폭탄
일명 “프로젝트 엑스레이(Project X-Ray)”로 명명된 미국의 이 사업은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박쥐의 특성을 이용해 일본군 요새나 거점에 대한 방화 무기로 사용하려던 사업이다. 미국의 영부인 엘라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1884~1962) 여사의 지인인 치과의사 리틀 애덤스(Lytle Adams) 박사가 제안한 이 폭탄은 새장처럼 생긴 틀 안에 브라질자유꼬리박쥐(Free-tailed Bat)를 26개의 격실에 수용하고, 각각의 박쥐에게는 타이머가 달린 발화 장치를 달아놓은 형태였다.
폭탄을 공중에서 투하하면 낙하산이 개방되어 천천히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박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며 적지의 어두운 건물 틈새나 동굴, 지붕 아래 등으로 찾아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잠시 후 타이머가 작동하면 적 기지나 요새, 도시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원리다.
이 사업은 1942년 1월에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되었으며, 루즈벨트가 이 계획을 마음에 들어 하여 같은 해 말부터 연구가 시작됐다. 특히 일본은 목제 건물이나 대나무 재질 등 발화하기 쉬운 자재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사업은 몇 차례 시험을 시행하여 성공하기도 했지만, 한 번은 시험 중 박쥐 한 마리가 시험장인 뉴멕시코 주 칼즈배드 육군 항공대 기지 내의 연료 탱크 안으로 기어들어가 발화하는 바람에 대폭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 발생 후 육군은 이 사업을 해군에게 넘겼고, 그 해 말에는 해군이 해병대로 넘겼다. 결국, 이 무기가 1945년 중반까지 실전화되기 힘들다는 보고가 올라가자 책임자였던 해군참모총장 어네스트 킹(Ernest J. King, 1878~1956) 제독은 직접 이 사업을 취소시켜버렸다. 이 시점까지 이 기상천외한(?) 무기 개발비로 $2백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됐지만, 불과 얼마 후에 핵무기 개발이 성공하면서 모두의 기억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빙하 군함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과 추축군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걸친 넓은 해역에서 대규모 해전을 치렀다. 하지만 군함은 그 거대한 규모 때문에라도 단기간에 건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 이 와중에 영국의 발명가인 제프리 파이크(Jeoffrey Pyke, 1893~1948)는 “얼음”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당장 해군력 보강에 관심이 컸던 영국 정부가 반응을 보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물 86%와 목재 펄프 14%로 이루어진 “파이크리트(Pykrete)”라는 물질로 배를 건조하는 것이었다. “하바쿡(Habbakuk)”이라 명명된 이 콘셉트는 실제 캐나다에서 1,000톤급 군함을 모델로 하여 건조에 들어가려 했었지만, 엔지니어들은 작업에 착수하면서 곧 소성유동(塑性流動, plastic flow)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중 때문에 구성체로 쓰인 얼음이 녹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항상 배를 섭씨 -16도로 유지해야 했던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배의 골조를 유지하기 위해 10,000톤의 강철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애당초 강철을 쓰지 않기 위해 얼음으로 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이미 이 ‘얼음’ 배는 의미를 잃어 사업은 흐지부지됐으며, 결국 왕립 해군 측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하바쿡”은 파트리샤(Patricia)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혀 버렸다. 물론 배는 자연히 녹아 없어졌다.
►방벽 돌파용 바퀴
히틀러가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유럽 해안을 따라 높이 2m짜리의 “대서양 방벽(Atlantic Wall)”을 세우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영국의 무기 개발국(DMWD)은 이 방벽을 허물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그레이트 팬젠드럼(The Great Panjandrum)”이라 명명된, 병렬로 세운 두 개의 거대한 차륜 바퀴를 약 1.8톤의 폭약통으로 연결한 물건이었다.
약 3m 높이에 두께 2.1m인 콘크리트를 돌파하도록 만든 이 대형 “바퀴” 틀에는 로켓이 설치되어 방벽에 충돌하기 전까지 시속 97km의 속도로 굴러가도록 제작했으나, 문제는 양쪽 차륜 바퀴에 설치된 추진용 폭약이 균일하게 터지지 않을 경우 원래의 진행 방향을 벗어난다는 점이었다.
또한, 해안에서 달리다가 작은 구덩이나 모래 언덕을 밟을 경우에도 코스를 벗어나 버렸다. 과학자들은 추진력 안정을 위해 로켓을 더 달아보는 등 많은 시도를 했지만, 1943년경 마지막 실험 때 우측으로 방향을 튼 팬전드럼이 시험과정을 지켜보던 실험자들과 귀빈들 쪽으로 굴러오다가 아슬아슬하게 비켜 바다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그레이트 팬전드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
►공기 대포
이번엔 독일 측에서 개발한 무기다. 연합군의 유럽 본토 폭격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한 공장이 대공 무기 용도로 길이 10m, 지름 92cm의 대포를 생산했다. 이 포는 수소와 암모니아 혼합물을 탄환으로 썼으며, 기폭 시킬 경우 포탄 대신 압축 공기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도록 제작됐다.
실제로 제작된 이 ‘바람포(Wind Kanone)’는 약 200m 전방까지 강력한 바람을 뿜어냈지만, 항공기를 “밀어낼” 힘까지는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잡을 만큼 속도가 빠르지 못했다. 결국, 독일은 대인 무기로 전환해 보병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엘베 강 강둑에 설치했으나, 안타깝게도 워낙 덩치가 큰 무기다 보니 연합군 폭격기의 쉬운 표적이 되어 쉽게 파괴됐다. 결국, 공장에 방치된 채로 있던 이 “공기 대포”는 1945년 4월, 연합군이 진주해 공장을 접수하면서 미군 손에 들어갔다.
►풍선 폭탄
1944년경 일본은 태평양에서 약 9,000개의 풍선에 약 10m 지름 짜리 구체(球體)를 매단 후, 이 안에 약 16kg 고폭탄과 약 7kg의 소이탄을 넣어 띄웠다. 일본의 계산은 이 풍선들이 제트 기류를 타고 태평양을 3일간 건너면 미 본토와 알래스카 삼림 지대 위에서 대량으로 투하되어 대 화제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실제 미 본토에 닿은 것은 389개에 불과했으며, 그중 제대로 폭발한 풍선은 몇 개 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중 두 개는 일본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따른 알려진 피해도 단 한 건으로, 1945년 5월 5일, 피크닉 중이던 다섯 아이와 임신한 주일학교 교사가 오레곤 숲 속에서 우연히 이 풍선을 건드려 폭발하면서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뿐이다. 일본 측은 그럴듯해 보였던 이 아이디어가 먹혀들지 않자 크게 실망했으며, 결국 1945년에 이 계획을 완전히 폐기했다. 풍선은 50, 60년대를 넘어 1970년대까지도 미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됐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현대에 와서도 신무기 개발은 계속 진행됐다.
►멀미 광선
1950년경, 미국에서 의문의 헬기 추락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수사관들은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 사이로 태양광이 거치면서 특정 주파수를 낸 것이 어지러움과 속이 메스꺼운 증세를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이 문제는 색 유리를 도입하고 헬멧에 선바이저를 달면서 해결됐지만, 미군은 이것을 무기화할 수 없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07년경 결국 이 ‘멀미 광선’을 제작하는 데 성공해 버티고(vertigo) 현상과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데이저 레이저(Dazer Laser)”를 제작했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용화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지 않았다. 일단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적이 계속 직사광선을 맞아주고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고, 그나마도 선글라스를 끼거나 중간에 가로막는 물건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는 이 “레이저”의 크기가 38cm x 10cm에 달하다 보니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실물은 상용화된 상태이며 약 1km 거리에서 효과가 있다.
►악취 폭탄
최초 미국과 이스라엘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던 비살상용 무기로, 주로 시위 진압 등에서 인명 살상 없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공통으로 혐오스러워하는 냄새를 특정 공간 안에 뿌림으로써 스스로 그 지역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발상이었으며,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산속 동굴에 은거한 탈레반 반군 등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됐었다.
특히 최루탄과 달리 화학 부작용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쏠렸었다. 문제는 인간이 혐오하는 냄새라는 것이 문화권에 따라 김치, 치즈 같은 발효 음식 냄새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듯 문화적 관습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톨(대변 냄새)과 황 화합물 냄새(시신의 부패 냄새)처럼 대부분의 인간이 혐오하는 냄새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도 진행 경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보인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실패작들이 많아 보이지만, 자고로 모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사고의 틀을 깨는 신무기가 탄생하는 법이다. 미국이 국방고등연구사업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예산으로 연간 $28억 달러(약 3조 원)를 쏟아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99가지의 아이디어가 실패하더라도 획기적인 단 한 가지가 성공한다면 전장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DARPA”에 준하는 일본 국방 기술개발 연구기관을 창설하여 일본 산업계 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첨단 기술을 향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 속에서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나, 미국의 경우는 국방비 중 11.5%에 달하는 예산을 국방 연구개발비로 활용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도 작은 한국이 R&D에 투자하는 규모는 절반인 약 6.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 개발비가 부족하다 보니 기초 기술보다는 체계 개발이나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높은 연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먼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무릅 쓴 도전과 경험도 중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