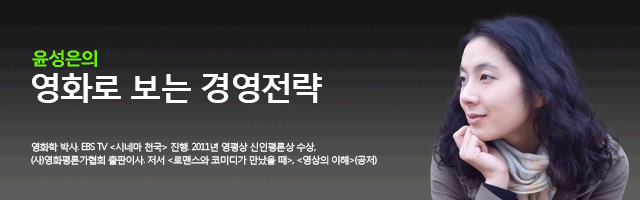<드래프트 데이>(감독 이반 라이트만)는 이달 10일 개봉한 최신영화이다. 주인공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식축구 구단장! 주인공의 직업상 지난번 소개한 <머니볼(Money Ball)>과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화를 연이어 다룬 의도는 소규모로 개봉하는 이 작품이 완전히 묻히기 전에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다.
캐빈 코스트너와 제니퍼 가너가 남녀주연으로 출연함에도 미국에서도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한 작품이지만, 스포츠 영화가 아닌 경영적 관점에서라면 충분히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으니까.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 종목인 미식축구(American Football)의 빅 이벤트 ‘드래프트 데이’는 팀의 미래를 결정할 신인선수를 선발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영화는 <머니볼>과 마찬가지로 인사 경영(personnel management)과 관련이 있지만, 신인 선발전 당일과 구단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시공간에서 드라마가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자 매력이다.
경기장 밖 결전의 그 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단장 써니는 자신이 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비장하게 집을 나선다. 그러나 타 구단장이 1순위 지명권을 건 거래를 제안해 오고, 구단주 역시 그 지명권을 이용해 팬들이 원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오라고 압박한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감독은 감독대로 다른 선수를 지목하며 써니를 잘근잘근 괴롭힌다. 그는 결국 1순위 지명권을 위해 3년간 1차 지명권을 포기하는 도박을 벌인다.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기 직전까지 써니가 애초에 원했던 선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래프트 시간까지 영화의 긴장감은 더해만 간다.
과연 써니의 선택은 누구였고, 그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예상대로 그는 모든 팀에서 노리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 대신 자신이 종이에 적었던 선수를 지목한다. 그것은 우선 구기종목 선수 선발의 중요한 기준인 ‘포지션(자리)’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 써니의 팀에는 부상에서 회복중인 쓸 만한 공격수가 있었기에 제 아무리 스타라 해도 또 공격수를 뽑는 것보다는 팀의 약점을 보완해 줄 포지션의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구단장이라면 누구라도 이 정도 판단력이야 갖고 있다.
하지만 ‘보이는 한 방’에 집착하는 구단주와 열성 팬들의 입김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선발하는 것이 구단장의 입지에도 나쁠 것은 없어 보인다. 이후 팀의 성적은 구단장 혼자가 아닌 공동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써니는 유혹과 압력을 물리치고 소신 있는 선택을 한다.
그런데 다소 의외인 것은 써니의 두 번째 기준, 즉 ‘인성’이다. 구단주가 원했던 공격수는 태클을 당하면 쉽게 흥분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대충 얼버무리며, 팀의 우승을 향한 열망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수임이 밝혀진다.
뛰어난 선수에게 훌륭한 인성까지 요구하다니. 게다가 그것이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다니 감상적이다 못해 낭만적이다. <머니볼>의 빌리 빈은 부상 당한 선수를 가차 없이 팀에서 내보내는 냉혈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선발기준을 잘 조합해 보면 써니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조화’라는 하나의 가치로 요약된다. 약한 포지션을 보완함으로써 팀 전력의 전체적 균형을 맞추고, 모든 선수가 하나 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다. 팀에 친한 친구 한 명 없을 만큼 평판이 나쁜 선수를 들이는 것은 써니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스포츠팀 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조화를 고려한 인사는 얼마나 중요한가. 가능한 한 겹치는 포지션 없이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
<드래프트 데이>와 써니가 주는 교훈은 이 두 가지일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안목의 인사 경영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