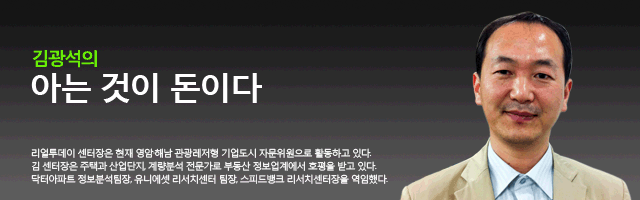멀지 않은 미래(2019년)를 그린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다른 행성으로의 인구이주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 속의 도시는 400층이 넘는 고층 건물로 빽빽한 거리와 건물 입면을 가득 메운 네온 간판들이 즐비하다. 전문가들은 미래 주거 형태가 현재의 아파트 일색에서 벗어나 주상복합오피스텔, 테라스하우스 형식으로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연 10년 후 우리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자.
멀지 않은 미래(2019년)를 그린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다른 행성으로의 인구이주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그리고 있는 이 영화 속의 도시는 400층이 넘는 고층 건물로 빽빽한 거리와 건물 입면을 가득 메운 네온 간판들이 즐비하다. 전문가들은 미래 주거 형태가 현재의 아파트 일색에서 벗어나 주상복합오피스텔, 테라스하우스 형식으로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연 10년 후 우리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자.
◆사람보다 빨리 늙어가는 도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래 행위는 평균적으로 30년을 내다보는 베팅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연령은 16.9년(국민은행 아파트 단지 정보 기준)이고 인접지역인 인천은 평균 20.3년으로 사람으로 치면 중년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동탄‧판교 등 2기 신도시에 젊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경기지역은 그나마 젊은 축에 드는데도 그래도 아파트 평균 나이가 16.1년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 평균 연령은 17.5년이다. 아파트 수명을 30년이라고 보면 중반을 넘어섰고 좀 길게 봐서 40년이라고 해도 사람으로 치면 중년에 가까운 나이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1980~9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탓에 불과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3분의 1가량이, 20년 후에는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수명을 다한다. 이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자녀의 교육, 노후 생활비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노후에 우리가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곳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내부를 멋지게 단장하고 최신 내부 구조, 첨단 설비가 들어선 새 아파트는 인기가 높고 가격도 높게 매겨지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는 이상하게도 오래되면 몸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가 들어선 건물과 달리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계속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땅의 잔존가치가 큰 강남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기도 했다.
아파트는 부동산광풍이 불 때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가 뜸할 때는 금방 잊혀진다. 최근 주택 거래가 별로 없고 가격이 주춤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모두가 부동산을 잊고 있을 때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수명을 다해가는 아파트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만에 대한민국 주거의 표준이 된 아파트
우리나라 주택에서 아파트를 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된 시기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택건설은 중소기업이나 수공업자들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주거형태는 대부분 단독주택이었다. 실제로 1975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따져보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는 1961년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얻은 결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정부 주도로 서울 강남·여의도·목동 등의 주거지역이 도로망 등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개발됐다. 즉, 성장에 목말라 있던 정권의 개발 의도로 추진된 도시정책의 일환이다. 그 결과 1962년 마포 아파트 건설을 기점으로 1992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190만 가구로 우리나라 총 주택에서 23%를 차지하는 엄청난 물량이 공급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는 일반인에게도 재테크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본래 아파트는 좁은 땅을 고도로 이용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산물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이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한 집합 주택 형태를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상륙하면서 맨션이란 용어가 붙었고 본래와 다른 상품으로 변모했다. 대상고객을 서민이 아닌 중산층 이상을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서민층의 아파트와는 다른 형태로 줄기를 틀어 발전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의 유가 파동은 아파트 수요를 더욱 부채질했다. 저렴한 관리비는 주부들의 관심을 끌었고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친 고객들에게는 아파트의 편의성이 큰 장점으로 부각됐다.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신분 계층이 강남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사회적 신분 상승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다.
아파트의 편리함에 따른 수요 증가와 투자수요가 맞물리면서 이후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주거상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90년도 우리나라의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2.74%를 기록한 데 이어 2000년에는 47.7%, 2005년 53%, 2010년 5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면적이 같으면 거의 똑같은 집을 제조업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개성이 없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우리나라 전세제도와 더불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주거 문화다.
◆강남 불패로 이해되는 강남 아파트
2000년대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강남 불패신화는 아파트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꼽힌다. 60년대만 해도 모래 벌과 뽕나무밭이었던 강남이 신흥개발지로 70년대에 대규모 개발에 성공한 것을 두고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아파트 밀집에 한탕을 노리는 투기 열풍이 분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질 시기였다. 투기 열풍이 잠시 식을 무렵 강남 지역은 1974년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로 꼽혔던 경기고를 시작으로 서울고, 휘문고, 숙명여고 등의 강북 명문 학교가 줄줄이 이전하면서 최고의 인기 학군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로써 강남 아파트는 80년대에 두 번째 전성기를 맞게 된다. 아파트의 양적 공급 확대와 주거의 질 향상,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강남에 집을 살 여유가 안 되면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강남에 있는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넘쳐났다.
위의 그림은 1976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노란색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말하고 하얀색은 개발이 안 된 곳이다. 70년대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인 모습을 보여준다. 80년대 들어서 공동주택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래도 아직 개발할 땅이 많았다.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모자라면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더 지으면 됐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자 큰 땅에는 아파트가, 자투리 땅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를 배후 수요로 한 상권이 눈에 띄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개발할 땅이 더는 남아 있지 않다. 앞으로 강남은 어떻게 변화할지 사뭇 궁금하다.
리얼투데이 김광석 실장(www.Realtoday.co.kr)
리얼투데이 김광석 센터장은 현재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주택과 산업단지, 계량분석 전문가로 부동산 정보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닥터아파트 정보분석팀장, 유니에셋 리서치센터 팀장, 스피드뱅크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