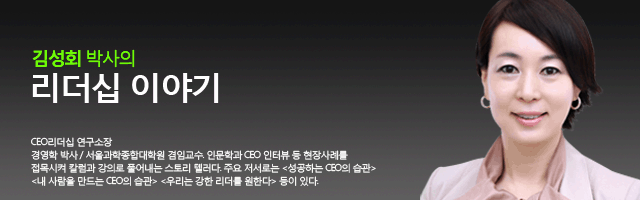리더의 우선임무는 교화다
국내 모 기업에서 공자의 군자 리더십을 강의했다. 반응은 “군자처럼 회사를 경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고민이었다. 한마디로 참 좋지만 요즘 시대와 현재의 조직상황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여러분은 어떤가. 군자처럼 되고 싶지만 군주처럼 군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조건, 仁의 리더십은 ‘참 좋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 가능한 것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경공이 공자를 등용하려 하자, 명재상 안영이 말한 반대의 이유를 떠올리게 된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
“공자는 고대문화에 젖어 있지만, 소화를 시키지 못한 사람으로서 요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천자가 임금의 지위를 선양하고 대신이 자기를 대신할 현자를 추대하는 요순시대의 평화 시절이라면 모르겠지만 요즘의 시대(약육강식의 춘추전국 상황)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인물입니다.”
많이 본 듯한 논조 아닌가. 바로 우리가 공자를 대하며 하는 이야기다. 좋은 말이지만 오늘날 사회와 현실에 맞지 않는 뜬구름 논리란 비판이다. 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은 현실에 먹히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인으로 대하니 만만하게 보고 조직이 해이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리더가 “역시 현실에선 겁주고 압박하는 게 먹히고 성과가 나더라”며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말하곤 한다. 예나 지금이나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생각은 많이 했던지 춘추시대 말기의 세력가인 계강자 역시 공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한다.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해 올바른 도리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벌백계를 통해 조직의 질서를 한순간에 잡겠다는 이야기다. 공자는 이에 대해 따끔하게 “왜 정치를 하는데 형벌의 방법만 생각하느냐. 선생께서 선해지고자 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저절로 선해진다”라고 말한다.
제자 번지가 ‘仁’에 대하여 물었을 때 공자는 ‘애인’이라고 말해준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말하자면 인간 존중의 정신이다. 공자는 실제로 이 같은 인간 존중의 정신을 실행에 옮겼고 높은 성과를 이뤄냈다. 그가 50대 황금기를 맞아 맡은 일은 대사구, 말하자면 오늘날의 법무장관 일이었다. 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치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두 가지를 접목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이론가나 몽상가일수록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딪혀 이념을 내동댕이치는 것, 많이 보아왔으니 말이다.
꿈은 높은데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과 구성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고선 좌절해 더 반동적인 ‘독재적’인 리더로 변신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지 않는가. 순진한 백면서생 리더들은 자신들의 탁상공론 이데아가 스폰지처럼 쏙쏙 받아들여지기는커녕 반발하거나 이용하는 구성원들을 보고선 좌절하곤 한다. 그래서 보통 리더보다 더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리더로 회귀하거나 자포자기해 방관형 리더로 전락하곤 한다. 역시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며... 더구나 공자는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비리와 범죄를 다뤄야 하는 만큼 국가의 가장 문제 되는 환부를 치유해야 하는 현안에 당면하고 있었다. 공자가 부딪힌 현장은 과연 호락호락했을까?
공자는 법률도 중요하지만 덕치와 교화를 강조했고 실제로 이를 실천했다.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다른 일들만큼 잘해낼 수 있는데....허나 그보다는 무엇보다 송사가 없었으면 좋겠구나.”(안연)
공자는 “송사를 처리함은 나도 남과 같겠으나, 반드시 송사함이 없게 하리라”라고 했다. ‘片言折獄(편언절옥. 한마디 말로 송사(訟事)의 시비를 가린다는 뜻으로, 몇 마디 말로 송사의 시비를 가려 명쾌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비유)’의 능숙한 재판보다 ‘無訟(무송)’의 상태에 이를 만큼 덕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자는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나서, 뿌듯함이나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했다. 척척 많은 판결을 해내 능력을 인정받는 판관이 되기보다 덕과 신의를 쌓아 죄를 짓지 않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사후 처벌이 아닌 범죄의 사전 억제 효과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신조였다.
공자의 언급은 아니지만, 증자가 옥관으로 새로 부임하는 제자 양부에게 해주는 말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이 등장한다. 노나라 실력자인 맹씨가 양부를 사사(士師: 고대 중국의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 獄官)로 임명하자 양부가 스승인 증자에게 옥사의 처리에 대해 물었다. 증자는 이렇게 말해준다. “윗사람이 도리를 잃어 백성들이 이반한 지 오래되었다. 만일 이반한 실정을 알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孟氏使陽膚為士師,問於曾子。曾子曰 上失其道,民散久矣 如得其情,則哀矜而勿喜-자장-)
백성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리더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명판결의 ‘사후약방문’을 했다고 의기양양해하기보다 그것을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교화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라. 그런 지경에 이른 백성의 사정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자의 이 같은 신조를 짐작하게 하는 일화가 있다. 일을 할 때 민첩함을 강조한 공자가 3개월이나 재판을 유야무야 질질 끈 부자(父子) 소송 이야기다. 과연 공자는 왜 3개월이나 판결을 질질 끌었던 걸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부자 사이에 소송을 벌이는 자가 있었다. 공자는 그들 부자를 같은 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석 달이 되어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 되는 사람이 소송을 중지해달라고 청하였다. 그제서야 공자는 이를 허락하고 용서해주었다.
노나라의 실권자로서 공자를 중용한 장본인인 계손씨가 공자가 부자를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만을 표했다. “사구(공자)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지난번에는 나에게 ‘국가는 반드시 효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나는 이제 불효자 한 명을 죽여 백성들에게 효를 가르쳤으니 또한 옳지 않은가’ 하더니 이제 와서 저 불효한 자를 용서해주다니 앞뒷말이 안 맞지 아니한가?”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그 뒷담화를 전해들은 제자 염유가 이 말을 공자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탄식한다.
“효를 가르치지 않고서 죄를 재판함은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중략) 반드시 가르치고 난 다음에 형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에 옛날의 성왕께선 도덕을 제정하여 이를 솔선수범하셨다. 그래도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어진 신하를 시켜 이를 권장하셨고 그래도 말을 좇지 않으면 따르기 쉽도록 번거로움을 제거하셨다. 최종적으로 안 될 때에 비로소 위엄으로 겁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삼 년을 두고 노력하여 백성들이 바르게 인도되었다. 그래도 간사한 일부 사람들이 교화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형벌에 처하셨으므로 온 백성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교화하지 않고 형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없고 어지럽게 만들어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하면 곧바로 처벌한다. 그러므로 형벌이 무거워질수록 도둑이 점점 더 늘게 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낮은 언덕인데도 빈 수레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가파르기 때문이며, 높은 산인데도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올라가는 것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의 죄의 언덕길은 너무 완만하다. 그러기에 형법이 있어도 백성들이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다.”
즉, 형벌을 가하고 가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가 그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었느냐 하는 것이다. 도덕으로써 인도하고, 어진 사람들을 롤모델로 권장하며 위력으로 겁을 주고, 처벌하는 것은 맨 하수의, 그리고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동원하는 최종 수단이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며 인의 허망함을 주장하기에 앞서 리더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은 과연 ‘조직의 규율을 얼마나 성의 있게 가르쳤느냐’ 하는 점이다. 가르치지 않고 관용만 베푸는 것은 방임이고, 가르치지 않고 처벌 만능만 외치는 것은 횡포다. 공정한 상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구성원들을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교화’시키고자 노력했느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