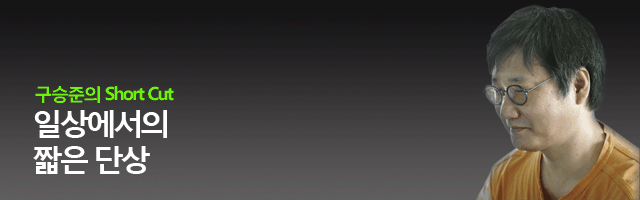사실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더라’는 소문은 일찌감치 횡행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는 종업원이 방탄유리 안에서 주문을 받고 돈도 기계를 통해 주고받더라,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줄줄이 텅 비어 있고 집 한 채를 1~2달러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더라, 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감옥에 가는 애들이 하도 많아서 고교생들의 졸업률이 25퍼센트밖에 안 된다더라, 반려동물들마저 버려져서 들개처럼 돌아다니고 코요테, 비버, 꿩 같은 야생동물들이 돌아온다더라….
사실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더라’는 소문은 일찌감치 횡행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는 종업원이 방탄유리 안에서 주문을 받고 돈도 기계를 통해 주고받더라,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줄줄이 텅 비어 있고 집 한 채를 1~2달러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더라, 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감옥에 가는 애들이 하도 많아서 고교생들의 졸업률이 25퍼센트밖에 안 된다더라, 반려동물들마저 버려져서 들개처럼 돌아다니고 코요테, 비버, 꿩 같은 야생동물들이 돌아온다더라….
미국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디트로이트 시를 지난 적이 있다는 한 후배는, 톨게이트를 지키는 직원들마다 눈을 부릅뜨고 경고를 하더라며 으스스한 표정을 지었다. “베이비, 차문을 꼭 잠그고 이 도시를 빠져나갈 때까지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한낱 오락영화로 즐겼던 <로보캅> 시리즈는 몰락해가는 디트로이트에 보내는 묵시록적인 예언이자 경고장이었나 보다. 1987년에 개봉한 <로보캅1>이 범죄 집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치안 부재’의 디트로이트 시를 무대로 한다면, 1990년에 개봉한 <로보캅2>는 시 전체가 파산한 후, 범죄 조직으로부터 마약 판매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부채를 변제받는 ‘도덕적 파산’을 다룬다.
스크린 속의 디트로이트는 현실의 디트로이트와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았다. 현실의 디트로이트는, 지난 7월 18일 미국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대 규모인 200억달러(22조원)의 파산 신청을 해 영화가 보여준 예언을 ‘달성’했으며, 여기에는 붕괴 조짐이 뻔히 보이는데도 과거의 영화(榮華)에 대한 집착과 무분별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각계각층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디트로이트의 파산 소식을 알리는 미디어의 행태다. 많은 언론이 “강성 노조의 등쌀에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도시가 파산했다”는 음모론을 일반적인 시각처럼 내세우는데, 왜 바늘만 한 이유를 가지고 몽둥이만 하게 과장하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해졌다. 모 언론이 디트로이트의 파산이 남 일이 아니라며 ‘현대차’와 울산의 관계를 빗대어 경고하는 대목에서는, 이거야말로 모종의 음모를 가진 여론몰이가 아닌지 앞질러나가는 생각도 스쳤다.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디트로이트’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강성 노조’가 떠오른다. 지금은 코웃음을 치며 보지만, 훗날 “디트로이트 파산 뒤에는 강성 노조가 있었다”는 해석이 정설이 되어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을까.
물론 “1977년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면, 뉴욕 맨해튼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벌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인 고임금을 누렸던 것은 사실이다. 도시의 파산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연금 혜택을 보전하는 데만 기를 쓰는 노조의 탐욕을 감싸줄 수 있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강성 노조 때문에 미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도시까지 몰락한 것이라면, 디트로이트를 떠나 미국 남부 등지로 이전한 후에도 자동차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타임>은 지난 2008년에 이미 ‘올해가 디트로이트의 마지막 겨울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자동차산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소형차 개발 외면, 고임금 등 인건비 부담, 강성 노조, 연비개선 실패 등을 꼽으면서도,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경영 패러다임에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의 창설자 헨리 포드와 GM의 기틀을 마련한 알프레드 슬로언의 1920~30년대 상명하복식 경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보니, 현장과 유리된 CEO는 다른 기업을 사고팔거나 직원 감원 등 숫자놀음에만 매달리게 되고, 중간 간부는 상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 틈을 파고들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알다시피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다.
한때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출판사의 편집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번역료를 깎아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모든 번역가며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의 작업료를 모두 깎으라고 사장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허허, 그 돈 깎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닌데, 그냥 하시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 번만 봐달라는 말에 못 이겨 청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며칠이 가지 않아 그 출판사가 사장의 독단으로 외국 작가의 작품을 거액의 판권료를 들여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어서 무리한 투자라는 게 드러나 계약을 파기하느라 며칠 만에 위약금만 날렸다는 소식도 들렸다. 1년 내내 담당 편집자들이 읍소하며 깎은 작업료의 2~3배도 넘는 돈을 한 방에 날린 것이다. 나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경영진의 경영 실책보다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